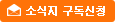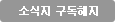사단법인소개
 > 글나라소식 > 글나라 소식지
> 글나라소식 > 글나라 소식지
- 상실과 애도, 그리움, 엄마라는 불가사의한 존재, 《H마트에서 울다》 by 미셸 자우너
- 제 106호 소식지
우리 엄마도 그랬다. 그 감각이 어리고 젊었을 때의 내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윤곽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날렵한 선을 좋아하는 나는 왜 헌 신발을 만들어 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엄마의 그런 살뜰함이 내겐 숨막힘이기도 했다.
나름대로 공감력이 낮지 않은 나는 그것이 신발을 길들여 내 발이 까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역할 바꾸기를 완벽하게 해내려면 엄마가 드실 음식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고.
음식은 우리끼리 나누는 무언의 언어이며, 우리가 서로에게 돌아오는 일, 우리의 유대,
우리의 공통 기반을 상징하게 됐다고. 170쪽 역할이 바뀔 때가 반드시 온다. 보호자였던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때가.
저자는 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엄마의 역할을 자신이 맡으려고 마음 먹었다.
음식이란 서투른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언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나도 추석 때 빠지지 않는 엄마의 토란탕과 잡채를 그리워하니까.
밀키트를 애용하는 나라는 엄마의 음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될까?
지금도 애들이 가끔 농담으로 '엄마의 손맛'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꾸 뒤가 켕긴다.
'손맛'이라는 말 들을 음식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이다.
글나라 쓰기마당
'상실과 애도, 그리움, 엄마라는 불가사의한 존재, 《H마트에서 울다》 by 미셸 자우너' 중에서
* 원문은 글나라넷(www.gulnara.net) 쓰기마당 글나라북클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