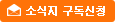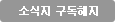사단법인소개
 > 글나라소식 > 글나라 소식지
> 글나라소식 > 글나라 소식지
- 제10회 글나라 독서감상문대회 청소년부 최우수상_인간 이순신과의 조우
- 제 100호 소식지
인간 이순신과의 조우 '칼의 노래'를 읽고
우리 역사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인물은 많다. 끈질기게 지속된 그 기간에 비하면 적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두운 위기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며 개혁을 이뤄낸, 허구보다 더 허구와 같은 역사를 제 손으로 써낸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명한 위인은 많다. 세종 대왕, 정조 대왕, 장영실, 정약용,
이이, 모두 우리 나라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거나 위기 속을 딛고 나와 빛으로 나아간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에게 깊이 꽂혔을 아주 유명한 사람을 오늘 이 독후감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이번 독후감의 제목은
[칼의 노래], 선조 때의 수군통제사였으며 임진왜란의 승패를 결정지은 해전의 공신인 이순신에 대한 소설이다.
충무공에 대한 창작물은 참 많다. 정말 유명한 영화인 '명량'부터 아이들 학습 만화까지.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임진왜란이어서 그럴까.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좋아해서 그런 걸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울했던 역사를 우리는 계속 떠올리고 다시 잊는다. 그 치열했던 임진왜란 중에서도 가장 창작물로 조각하고 싶었던
사람은 충무공이 맞을 것이다. 백성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명대사까지. 이만큼 상품성이 있는 이야기는 드물다고 생각했겠지. 이해한다. 그에 대고 뭐라고 비판할 생각도 없다.
단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의 충무공과 인간 이순신의 괴리감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순신은 내가 봤을 때 사람이 아니었다. 허구보다 더 허구 같은 삶을 산 사람이기에 내가 인간 이순신을 볼 날은 없다
여겼다. 어떤 창작물을 봐도 이순신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충무공으로 보였다. 나라에게 그렇게 버림받았음에도
다시 나라에 충성하고, 많은 적군을 참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병력으로 몇 백 배의 적을 무찌른 그는 너무 완벽해 보였기에
오히려 인간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공적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이해되지 않았고, 단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기에 그런 거라 넘겼다.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과 비교될 정도로 대단했다는 인물이기에 그저 초인으로
생각되었다. 내가 자주 보는 소설에서는 비슷한 등장인물이 많이 나온다. 호구처럼 보일 정도로 착하고, 머리가 좋고,
힘이 세고, 마지막까지 감동적으로 끝나는 인물이. 그런 인물만큼, 아니 오히려 그런 인물보다 더 이순신 장군은 내게
허구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괴리감이 깨질 일이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여겼다. 이순신을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생각을 산산이 부수었다. 1인칭으로 서술되는 이순신은 내가 아는 충무공이 아니었다.
아픔과 증오와 동정을 모두 느끼는 인간 이순신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무력한 왕에게
분노했다. 자신의 아들 면의 죽음에 오열했으며, 그를 떠올리게 하는 어린 일본 장수에게 동정을 느끼고 그 감정과 함께
장수를 제 손으로 참했다. 이순신이 백성들을 둘러보며, 적군을 베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무언의 설명이 내게 단번에 들어왔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아팠던 소설이었다. 측근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감에 따른
이순신의 슬픔, 적에 의해 자신을 죽이고, 다시 적에 의해 자신을 살리는 왕에 대한 증오와 나라에 대한 애정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뼈저리게 녹아 있었다.
현실감 없는 초인은 어디 가고 자신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미루고, 살아남으려는 한 사람의 투쟁만이 보였다. 소설 속
충무공은 인간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자신을 옥에 가둔 왕에게 분노했고, 소중한 이들의 죽음에 억장을 무너뜨렸다.
그 어떤 허구의 인물보다 강한 인력으로 나를 끌어들여 임진왜란의 참사 위에 던져놓았다. 핏물처럼 붉은 활자에 몸이 묶인
채 나는 그 시대의 편린을 보았다. 일군에게 베어지는 사람들의 모습과, 말똥에 섞인 곡식 낟알들을 주워 먹는 아이들과,
끌려가는 여인들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이순신과 하나가 되었다. 그가 보는 것을 보았고, 그가 듣는 것을 들었고,
그가 느끼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한평생 불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이 내게 성큼 다가왔다. 나는 이순신에게 몰입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은 전체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그저 참혹했다. 이 땅의 과거에 그런 피로 낭자한 역사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한번 훑고 넘겨 버렸던 한 단어, '임진왜란'이 배로 아파 보였다. 책을 읽을 때만큼은 나도 이
시대를 보고 살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일이 없었다. 이렇게 생생할 일인가. 이 책의 문체 역시 내가 묵직한 슬픔을
느끼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김훈 작가의 문체는 정말 간결하고 미사여구가 적다. 문장 역시 짧다. 그저 아름다워 보이려고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책의 문체가 시와 같다고 생각했다. 매우 짧고 핵심이 전부 들어 있고, 무엇보다 미사여구가 없음에도 아름답다는
점에서 그랬다. 나는 이 문체가 이순신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전쟁 상황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너무 간결해 건조하게까지 보이는 문체가 이 참혹한 세상에 다져져 희게 번진 이순신의 독백을 마치 바닷물처럼
적셨다. 중간 중간 나오는 한자체가 실체감을 높였다. 역사와 픽션이 교묘히 어우러진 범람 후의 마른 땅을 채우는 물
같았다. 이순신이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하지만 죽음까지 함께할 정도로 가까웠던 바다의 형상을 떠올리게 했다. 크게 오는
파도가 모래를 확 쓸고 지나가는 평화로운 모습과 피로 벌게진 홍해가 동시에 떠올랐다. 결코 겹쳐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
이순신의 칼에는 '일휘소탕 혈염산하'라는 글자가 박혀 있다고 한다.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라는 뜻이다. 나는 이 글에 담긴 의미가 오직 적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왔으나 방관하는 명군, 신하들을
의심하고 사지로 보냄으로서 보답하는 염치 없는 왕과, 이순신 자기 자신까지 그는 쓸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의 셋째
아들 면이 죽었을 때부터 그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묏자리가 이곳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를
머나먼 바다로 끌고 갔다. 그는 자신이 잠시나마 충성을 바쳤던 왕에게 죽고 싶지 않아 했다. 그저 '자연사', 명장 이순신이
바라는 결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숙원을 이루게 된다. 장군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죽음은 '전사'였으므로, 그는
그저 바다에서 죽고 싶어 했다. 아침마다 파도로 밝은 빛을 전해 주는 파란 바다에 그는 그저 가라앉기를 바랐다. 그저
허구의 드라마틱한 재미 때문이 아닌 자신의 자유와 평온을 찾기 위해 그는 바다에 잠들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여러 해전에서 승리한 충무공만이 아닌 '이순신'의 이야기가 널리 퍼졌으면
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공상에 빠졌다. 이순신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 그의 마지막은 달가웠을까. 답할 사람이 없는
질문이었다. '일휘소탕 혈염산하'. 몸을 젖히며 작은 목소리로 이 말을 되뇌었다. 창 너머에는 물살처럼 파란 나뭇잎이 파도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