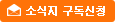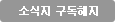사단법인소개
 > 글나라소식 > 글나라 소식지
> 글나라소식 > 글나라 소식지
- 제8회 글나라독서감상문대회 _중등부 최우수상
- 제 78호 소식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아름다운 삶과 생명 ___________________ 권규린
나는 며칠 전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의 작가는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며, 책에는 고독사, 자살, 범죄로 인해 사망으로 떠난 이들의 유품을 정리하며 이 유품정리사가 느꼈던 것들이 나와 있다. 책을 읽으며 나의 삶의 모습과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지, 내가 떠난 후에 무엇이 남겨질지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내가 떠날 때 무엇이 남겨졌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언제 떠날지도 모르니 무엇을 남기고 갈지도 모르겠고 떠날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어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은지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하였다.
생각한 끝에도 시원한 답을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저 나는 적어도 내가 떠날 때, 흔히 말하는 하늘나라라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삶 정도만 살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닌, 내 기준에서 부끄럽지 않을만한 삶 정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나 자신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기에 혹독할 수도 있는 것. 난이도와 상관없이 나 자신의 기준에서 당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자고 생각했다. 내가 떠나며 하늘나라로 갈 때,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며 쓴웃음이라도 좋고 찬웃음이라도 좋으니 그냥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걸으며 떠나게 되더라도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며 안아줄 수 있을 정도의 삶 정도만 살자. 생각했다. 어차피 내가 사는 삶이고 내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로 가든, 남들이 반대하는 길로 들어가든, 그게 지름길인지, 더 힘든 길인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문 중에 이런 글이 있다.
“수년 동안 죽음과 근접한 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것은, 어릴 적 어른들이 해주었던 말처럼 죽음이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추한 것도 아니다. 죽음은 그저 자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난 이 글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죽음을 아름답다고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다고 하기에도 어려우며 죽음을 추하다고 할 수도 없고 동시에 죽음을 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다. 고 말이다. 이 말은 죽음이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포함될 수 있기에 말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당장 생각해본다면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매우 아름다울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말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양면적이면서도 어떠하다고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죽은 것인가 아름답지 못하게 죽은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기준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남기고 갔을지 생각도 해주게 하며 그런 것들로 인해 깨달음을 얻거나 끊임없는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죽음’은 어쩌면 인간이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을 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나는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다. 죽음이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죽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이며, 아름다운 죽음 같은 것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은 죽은 사람일 뿐이다. 죽음에 대해 이름을 붙여주어도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무언가를 넣어 꾸며주어도 각자 저마다의 자신의 삶을 살다 저마다의 생각을 하고 죽은 것 뿐이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살았던 삶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도 나는 꽤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무엇보다 논리적이고 확실한 근거이며, 생명은 죽음을 맞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을 맞은 자가 생명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가 최대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각자 저마다의 인생을 살다가 저마다의 고민을 하며 저마다의 생각을 하고 살다가 죽듯 누군가가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 뭐라고 치부한들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인생을 살았고 참 아름다운 생명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나는 나도 나만의 생각을 하고 나만이 인생을 이 세상 속에 대입하며 그저 나는 나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에 나왔던 고독사, 자살, 범죄로 인해 삶을 끝맺음하게 된 사람들도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 대입시키며 살아왔을 것이고 죽음이 어떻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죽은, 소중한 ‘생명’이다. 나는 사후세계는 없다고 믿는 편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었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도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같은, 시시껄렁한 대화를 하며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아름다운 한 생명이었다고 말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며 인생을 끝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여서 나라는 아름다운 생명체를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자리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저 너머 세계이든,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아름답게 자신의 삶에 관해 이야기 할 테니까, 웃는 얼굴로 자신의 인생을 말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대단한 삶이 아니어도 좋고, 대단한 것들을 남기고 가지 못하여도 좋으니 그냥 사람들이 다 각자 저마다의 인생을 살다가 저마다의 고민을 하며 저마다의 생각을 하고 삶을 살다가 가듯이 나도 나만의 생각을 하고 나만의 인생을 이 사회라는 '속에 대입하며 그저 나는 나대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뜨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일이 어떻든 모레가 어떻든 나는, 우리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한 생명체이니까.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란 우리가 떠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저마다의 삶의 형태와 모습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