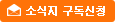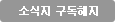사단법인소개
 > 글나라소식 > 글나라 소식지
> 글나라소식 > 글나라 소식지
- 제4회 글나라 백일장대회 고등부 산문 우수상 [거짓말]
- 제 26호 소식지
거짓말
고등부 이수진
거짓말. 무턱대고 그리고 이유가 없이 이런 말을 건넨다면 상대방이 느낄 감정을 상상 해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거짓말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도덕책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학습되어온 듯이 참된 언어 규범과 남을 속이는, 비윤리적 언행은 부적절하다고 일컫는다. 실생활에서 나, 타인, 여럿이 서로 화합하며 공존하는데 있어 항상 참된 행동을 지키려는 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작년 중학교 시절부터 국어 교육을 중점으로 시사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가령, 의사가 한 여인의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과장하여 문병 온 가족에게 살기까지 거짓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 거라 말한다면,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면 참담함과 비통함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의사는 꾸며낸 말로 환자가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 희망을 주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과연 거짓말은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입에서 귓속으로 내뱉은 말은 나도 모른다. 타인도 모른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나의 두 양심은, 그리고 굴러가는 두 눈동자는 이 모든 근거리에서, 진실을 보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누군가는 종종 착시현상 속 미지의 세계에서 감언이설의 말에 그 굴레의 늪 속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거짓말은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과 상처를 안기지만, 거짓말이 꼭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에 대한 일상생활에 묻어난 소소한 추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느덧 6월, 푸른 신록의 계절이다. 날씨도 화창하니 머지않아 여름이 앞서 다가왔나 보다. 완연한 풀내음이 도심을 가득 메울 때쯤, 작년 4월 1일 만우절 날, 담임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추억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등교 시간이었던. 동이 트고 뙤약볕이 학교 운동장을 내리쬘 때의 이야기가 오늘따라 더욱 생각난다.
중학교 3학년 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안부인사로 시작함이 익숙한 터라 조례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나는, 반 친구들이 계획한 만우절 이벤트를 열어 주기로 했다. 단순히 선생님을 깜짝 놀래시도록 천진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선생님이 어서 들어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교문에서 들어오신 담임선생님은 여느 때와 달리 진지하면서도 근심이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었다.
“편지가 왔네. 왜 이 편지가 왔을까?”
왁자지껄 소란스러웠던 반 분위기는 이내 숙연해지고, 28명이 공존해있는 싸늘해진 교실 속 분위기는 침묵만이 공백을 가득 메울 뿐이었다. 휘영청 깨알 같은 작고 모래알만한 글씨 담긴 A4용지를 허공에 펄럭이며 침착하게 마음을 다 잡고 이야기를 꺼냈다. 본론은 이랬다. 담임선생님께 보내 온 한통의 편지. 공부도 어지간히 보통이며 중학교 학교 생활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한 아이. 반장은 그 편지를 읊어 내려가며 말문을 쉽게 열지 못하였고 스타가토처럼 짧게 끊기고 이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모두의 눈동자는 혼란 속으로 갸우뚱하기도 하였으나, 아침 조례 시간에 생겨난 일이니만큼 예삿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호된 꾸지람을 듣고 쉬는 시간의 종소리가 울림에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움직일 수도 없었으므로, 우리는 석고상처럼, “그대로 멈춰라.”
4월 1일 만우절, 선생님께. 작게나마 시나리오를 짜 계획한 첫 만우절은 이로서 종결되겠구나. 아. 만우절임도 망각 속으로 머릿속은 온통 백야 현상에 흰 눈만 휘날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다시 한 번 말하건대 학기 초반에 이런 편지가 와서 대단히 놀랬단다.
-드륵. 문이 열렸다. 문이 닫혔다. 우리는 모두 책상만, 혹은 칠판만, 천장만, 응시하고 있다.
-드르륵. 문이 열렸다. 문이 닫혔다. 다시 담임선생님께서 교실 안으로 다시 들어오셨다.
반장은 다시 하얀 종이, 의문의 종이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있었고, 문장의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당혹케 한 결말을 잊을 수 없다.
- 2014년 4월 1일. 담임선생님이 큰소리 뻥! -
야유가 터졌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몇몇은 선생님의 깊은 연기에 눈물을 찔끔- 훌쩍이는 친구들도 있었다. 웃음으로 되찾아온 교실. 얼음땡 놀이라고 비유하면 괜찮을까. 선생님 손 아름에 가득 들고 있었던 ‘큰소리 뻥’ 과자 한 박스를 나누어 주어 굳게 경직되어 있던 분위기는 스르르 다시 녹아내렸다. 선생님의 대단한 연기에 찬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당혹감과 선생님의 낯설지 않은 여유가 묻어 나왔던 주객전도. 그날의 만우절의 일이다.
큰소리 뻥을 들고. 잠시 동안 아주 잠깐의 해프닝을 되짚어보았다. 빼죽- 웃음이 새어 나왔다. 허탈하기도, 선생님은 이런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을 몰랐다며 짙은 미소로 화답해주었다. 유구한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올해에는 중학교 1학년을 담임하고 계실 선생님. 1년이 지나 만우절이 되어 남겨주신 조례 시간의 추억. 구름과 같이 둥실둥실. 우리 반에서만 통했던 그 날의 일은 나의 기억에, 너의 기억, 우리의 기억에는 몇 년이 지나, 먼 훗날, 대학생이 되어 연륜이 묻어나 중년이 되었을 때에도, 모교를 회자하고 친구를 만나 나누는 학창시절이야기. 함박웃음으로 완연하게 피어날 화려한 봄 웃음일테다.
스승의 날, 이제는 중학생이 아니라, 모두 흩어져 다른 학교, 다른 반, 환경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옛된 동심의 세계는 아직 그 곳에서 머무르고 있기에, 여느 때 보다,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중학교를 찾아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사제간의 훈훈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들 따라 유독 높은 오르막길이 그리웠던, 모교를 찾아갔고, 선생님을 만나 뵌 만큼 1년이 지났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지난 3년의 학교생활이, 오랜 시간 동안 옛 우리 반부터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더욱 생각남은 내게 잊을 수 없는 행복이다. 여전히 인자하신 선생님도 불현듯, 하나 둘 기억나셨는지 만우절 우리의 일이 생생하다고 하셨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엔, 중학교 다닐 적에 자주 들렀던 학교 매점에서 큰소리 뻥을 사들고 교무실에 찾아가 선생님께 드리니, 어느새 거울에 비친 내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있었다.
만우절, 우리에게 조례 시간은 오르골처럼 천천히, 잔잔한 바다물결처럼 일렁이며
만우절,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