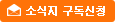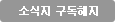사단법인소개
 > 글나라소식 > 글나라 소식지
> 글나라소식 > 글나라 소식지
- 제9회 글나라편지쓰기대회 최우수상_일반부
- 제 83호 소식지
양대리 큰 고모께.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 집안 정리를 하고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어요. 열린 베란다 문틈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내리 쬐는 햇볕 속에 있자니, 성큼 찾아 온 봄의 향기가 느껴져요. 고모가 계신 머나먼 그 곳도 이곳처럼 봄이 찾아오고 있을까요?
얼마 전, 퇴근길 아이들 아빠가 사온 딸기 맛을 보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적 고모 댁 딸기 밭 근처 코끝을 스치던 달콤한 그 향기가 그리워졌거든요. 딸기 밭을 헤집어 묻어 있던 흙을 툭툭 털어 입안에 넣으면 가득 퍼지던 그 행복감은 이제 먼 추억속의 이야기가 되었네요.
어린 시절을 집 보다 고모 댁, 부모님보다도 고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공장을 다니던 바쁜 아빠, 엄마 대신 언니는 외할머니 댁에, 저는 고모 댁에 맡겨졌지요. 그때는 당연한줄 알았지만, 아이 낳아 키워보니 아무리 조카라도 아이 하나 더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느끼게 되요. 그렇다고 제가 얌전한 아이도 아니었죠? 일찍이 고모부 여의고 언니, 오빠들 키우기도 힘든 형편인데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던 철부지였고, 얼마 안 되는 고모 화장품 얼굴에 찍어 바르고는 절대 화장품 안 만졌다 버티기도 여러 번이였죠. 그럴 때 마다 “이 여수 같은 계집애”라며 웃어넘기는 고모를 보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시는 그 깊은 속도 모르고 그저 혼나지 않음에 ‘고모가 잘 속아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리석게도 눈 가리고 아웅 이었지만, 그 덕분인지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도 눈칫밥 한 번 안 먹고 구김살 없이 성장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고모 덕분이었어요.
시장에 가실 때도 언니, 오빠들은 안 데려가도 저는 꼭 데리고 가셨지요. 하루에 몇 대 안되는 양대리 버스는 항상 사람들도 꽉 찼던 기억이 나요. 고모는 복잡한 시장에서 저를 잃어버릴까 손을 꼭 잡고 다녔는데 어렴풋한 기억 속에 전 몇 번이나 고모 손을 놓고 싶었어요. 사실 고모의 모습이 어린 마음에 창피했었거든요. 유난히 작은 키, 굽은 등, 툭 튀어나온 등 뒤의 혹. 일명 꼽추라는 척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모 모습이 당시에는 왜 그리도 창피하고 싫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며 한 번 더 쳐다보는 모습도, 혹여 아는 친구라도 만나면 놀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컸었던 것 같아요. 삼십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오를 때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져요. 작은 체구에 장애도 있었지만, 자식과 더불어 조카인 저까지 잘 키워주신 고모가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항상 고모에 대한 고마움과 마음에 짐이 있었기에 ‘나중에 크면 꼭 보답해 드려야지’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살아가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소식이 끊긴 동안 이미 오랜 투병생활을 하고 계셨고,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다녀갈 거리에 계셨었는데 너무 늦게 찾아뵙네요.
십 여 년 만에 고모를 다시 찾은 날 기억하세요? 원래도 작았던 몸이 이제는 아무것도 삼키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과 이온음료를 호스에 의지에 간신히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고모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었어요. 너무 늦게 찾아 온 후회의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렸지요. 그 와중에도 같이 데려간 제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살펴보며 “큰 애는 우리 은희 얼굴 많이 닮았네. 너 어릴 때 쌍꺼풀 짙었잖아. 꼭 닮았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라며 아이들 손잡아 주던 고모. ‘바쁜 언니, 오빠들 대신해 자주 찾아가 봐야지’ 했던 결심도 어느덧 일상으로 돌아오면 잊어버리고 가끔 고모 곁을 찾았지요. 뵐 때마다 건강 상태가 위태위태했지만, 그때까지 버텨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기다려주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 가지 못했고, 꽃잎이 흩날리던 그 해 봄. 고모는 그렇게 한 줌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은 입 모아 이야기했죠. “그렇게 오래 아프더니 차라리 잘 됐지. 그곳에서 더는 아프지 않을 테니까.” 들려오는 지인들의 말에 내심 서운했어요. 하지만 고모와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입관식을 지켜보며, 어쩌면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최소한의 살점만 남은 앙상한 뼈마디에 어울리지 않게 편히 감은 고모의 눈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편안해 보였거든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살기 바빠 누구하나 들여 다 보지도 않던 작은 요양병원에서 보낸 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고모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보다는 놓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있었던 생명의 끈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모가 떠난 후 한동안 무거워진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러다 신기하게도 고모가 제 꿈에 찾아와 주신 날 생생하게 기억나요. 너무 추웠던 꿈속에서 고모는 먼 곳으로 떠나야 한다며 두꺼운 옷에 목도리까지 둘러메고는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저에게 잘 지내라고 인사를 해주셨지요. 신기한 꿈에 잠을 깨고는 엄마를 보내고 상심이 클 고모의 큰 딸 기자언니에게 오랜만에 안부문자를 남겼지요. 그런데 뜻밖에 며칠 전이 고모의 49제였다며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는 문자가 되돌아왔어요.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한 채 떠나보낸 고모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힘들어 했던 저에게 ‘이승을 떠나기 전 잊지 않고 찾아와주셨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 콱 쏟아졌어요. 그만 힘들어하고 미안해했으면 하는 고모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거든요.
계절은 돌고 돌아 또 다시 봄이 성큼 찾아 왔어요. 봄꽃들도 여전이 흐드러지게 피고 지고를 반복하구요. 이맘때가 되면 오래 전, 양대리 딸기 밭 속을 헤집고 달리던 말괄량이와 그 철없는 작은 계집애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었던 작디작은 고모의 모습이 떠올라요.
양대리 큰 고모!
우리 언젠가 먼 훗날 다시 그곳에서 만난다면 못다 한 고모의 사랑에 보답하며 예전처럼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조만간 시간 내서 시원한 포카리스웨이트 한 캔 사가지고 산소로 찾아뵐게요.
그립고 또 그리운 고모. 그때까지 안녕히 잘 계세요.
-고모를 항상 그리워하는 조카 은희 올림 -